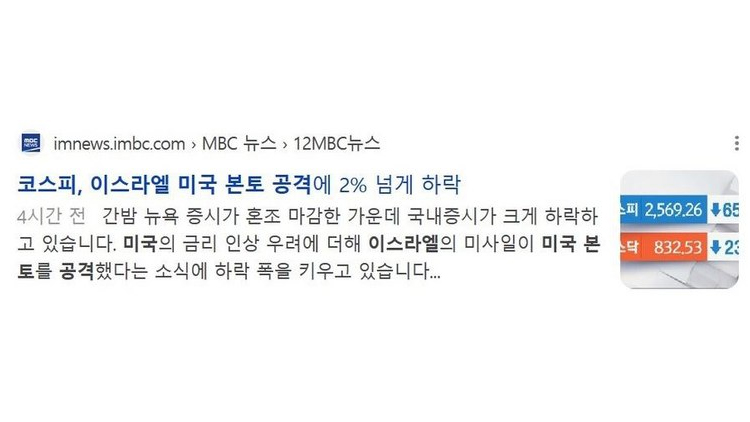* 스포일러와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작에서 '시'를 이야기한 감독이 이번엔 소설을 꺼내들었다. '버닝'은 무력한 청춘이 소설을 통해 비로소 발화하는 이야기다.
종수(유아인)는 가난한 청년이다. 좋은 집도, 멋진 차도 없다. 아버지는 감옥 갈 위기에 처해 있고, 어머니는 돈이 필요할 때만 그에게 연락한다. 해미(전종서)를 좋아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다. 한 마디로 마음대로 되는 것 없는 청춘의 표준이다.
![[영화리뷰] '버닝'…이창동, 소설을 말하다](https://img.tvchosun.com/sitedata/image/201805/21/2018052190067_0.jpg)
후반부 종수가 컴퓨터 앞에 앉는 장면 이후는 그가 쓴 소설로 보인다. 현실의 종수는 누군가를 죽일 만큼 대담한 인물이 못 된다. 오히려 소심한 순응형에 가깝다. 이는 종수가 비닐하우스에 불을 붙이는 장면만 봐도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붙인 불이 타오르자, 종수는 깜짝 놀라 꺼버린다.
내내 해미의 행방을 쫓던 종수가 벤(스티븐 연)의 혐의를 확신하는 순간 해미 찾기를 포기하는 것도 의아하다. 새 제물로 보이는 여자, 해미의 시계, 보일로 추정되는 고양이 등 모든 증거가 벤을 기소한다. 하지만 그 순간 종수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뜬다. 그러곤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는다. 가장 분노해야 하는 순간, 종수가 하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설을 쓰는 일이다. 소설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요, "제물"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단죄는 그렇게 소설에서 이뤄진다. 무력한 청춘이 현실을 전복할 수 있는 건 오직 허구를 통해서라는 자각. 영화의 처연함은 여기에 기인한다.
영화는 내내 현실과 허구, 진짜와 가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오간다. 해미의 팬터마임과 동네의 우물, 고양이가 각각 그것이다. 해미 방에 반사돼 들어오는 빛 이야기 역시 원본과 복제본, 이데아와 시뮬라크르를 떠올리게 한다. 종수가 자위를 하며 창밖의 서울타워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가 원본을 도모하는 모방자, 즉 소설가이기 때문이다.
![[영화리뷰] '버닝'…이창동, 소설을 말하다](https://img.tvchosun.com/sitedata/image/201805/21/2018052190067_1.jpg)
청춘과 그들을 위로하는 예술만 다뤘다면 영화는 한층 간명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버닝'은 정치적 메시지는 물론, 젠더 이슈까지 담고 있다. 이야기가 한데 모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그래서다. 세련된 영상미 뒤엔, 일견 '감각적이어야 한다'는 강박도 보인다.
과거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늘 의제를 품고 있었다. 끝내 '유효한 물음'을 던지고 말겠다는 의지, 그 온화한 치열함을 사랑한 팬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버닝'은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영화지만, 특유의 치열함이 약해졌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팬으로서 그의 변신에 박수 치면서도, 못내 아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