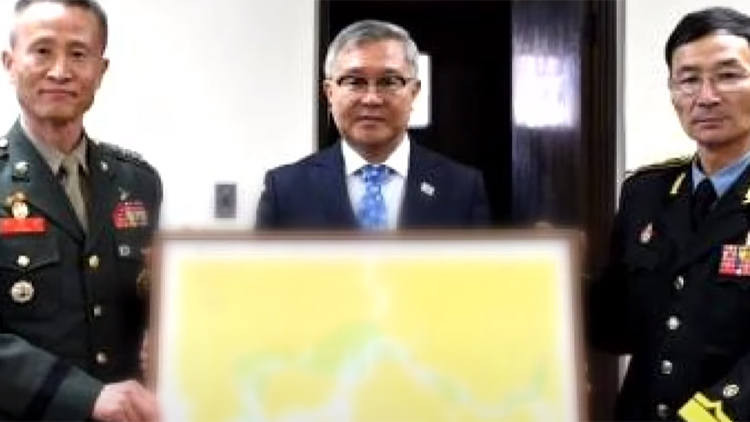"결국 나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인간이 됐다. 발뒤꿈치를 들고 걷고, 코를 푸는 게 아니라 눌러서 짜고, 가스를 배출할 땐 둔부 한쪽을 잡아당겨 소리내지 않는 기술을 터득했다…"
소설가 박민규는 베니어판으로 칸칸이 나뉜 고시원 사람들이 옆방에 들릴세라 방귀까지 소리 죽여 뀐다고 했습니다. 시골길 음식점들이 '가든'이라는 간판을 달고, 연립주택은 별장을 뜻하는 '빌라'로 부르고, 쪽방이 고시원이라는 이름을 내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요즘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없습니다. 날품 파는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노점상, 실직자에, 10대부터 노인까지… 맨몸 하나 눕혀야 하는 사람들이 찾아듭니다. 그나마 창문 달린 방에 붙는 돈 3~4만원을 아끼려고 관처럼 밀폐된 방에 스스로를 가둬야 하는 처집니다.
불 잘 붙는 자재투성이에 다닥다닥 붙은 방, 통로까지 좁아서 고시원 사람들은 늘 불길에 저당 잡힌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또 서울 도심 고시원을 불길이 덮쳐 고단한 목숨들을 앗아갔습니다. 고시원은 전국에 만개쯤에 이르고, 서울만 해도 인구 1퍼센트 10만명이 고시원에 삽니다.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 "가족들을 잊기 위해, 가족들을 잊지 못해, 가족들과 영영 헤어지기 위해" 삽니다.
가난한 연극배우가 숨진 지 닷새 만에 발견되고, 노르웨이 입양인이 엄마 찾아왔다가 소주병만 잔뜩 남긴 채 세상을 뜬 곳도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혈흔과 악취 제거 전문!' 인터넷 검색에 '원룸 고시원 고독사'를 치면 전문 청소업체 광고가 주르륵 뜹니다. 화려한 거대도시 뒤안길에 드리운 그늘이 짙습니다. 고시원은 밑바닥 삶의 쓰디쓴 시험, 고시를 매일 치르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뒷골목을 익명으로 떠돌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11월 9일 앵커의 시선은 '고시원의 희망과 절망'이었습니다.
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고시원의 희망과 절망
등록 2018.11.09 21:44
수정 2018.11.09 21:48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