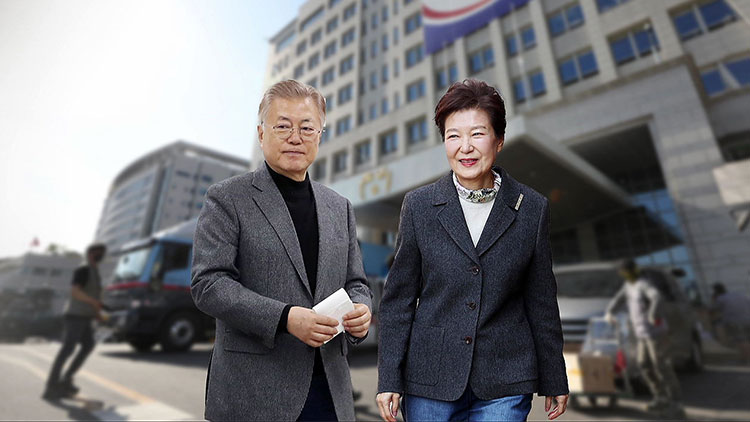[앵커]
한밤중에 갑자기 몸이 아플때면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연말에도, 휴일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고마운 곳이죠.
석민혁 기자가 이틀 동안 응급실의 밤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일에도 하루 100명씩 환자가 밀려드는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자동문은 쉴 새 없이 여닫히고, 의료진은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서로 뒤엉켜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등엔 정체 모를 낙서가 쌓여갑니다.
"바빠가지고 잊어먹을까봐 적어놓은 거에요."
중증 환자가 오면 응급실은 혼비백산, 환자의 폐와 심장을 대신할 에크모 장비가 오늘 밤에만 벌써 두 번째 가동중입니다.
이준호 / 한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첫 번째 환자는 7~80% 사망률, 두 번째 환자는 8~90% 사망률을 (현재 상태는?) 기적이 쓰여가고 있습니다."
또래 직장인의 칼퇴근은 그림의 떡입니다.
김홍준/한대병원 응급의학과 전임의
"주 52시간은 좀 꿈같은, 그냥. '아 그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많게는 36시간 연속 근무도 하지만 휴식공간은 변변치 않습니다.
응급실 전공의들은 3평 남짓한 이곳 당직실에서 길게는 1시간 안팎 눈을 붙이며 피로를 달랩니다. 8명이 함께 쓰는 이층 침대 한 개 뿐이지만 방을 치울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에는 정리를 해놓고 밤으로 가면 갈수록 개판이 되는"
한밤중엔 취객들의 행패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고벽성/ 한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가끔 있기 때문에"
책상엔 에너지 음료와 커피가 가득이지만 새벽 1시가 넘어가자 다리엔 힘이 풀립니다.
다음날, 해가 저물어가는 또 다른 응급실
"환자분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약품이 실린 카트를 몰고 숨가쁘게 병동을 돕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 꿈도 못꿉니다.
최은/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
"(식사 시간)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지만 고된 일상에도 이들은 응급실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상환 / 한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그래도 응급의학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환자를 최전선에서 보고, 막고, 진짜 의사 같은, 의사라는 느낌"
오늘도 2200여명의 의사와 6800여명의 간호사들이 응급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