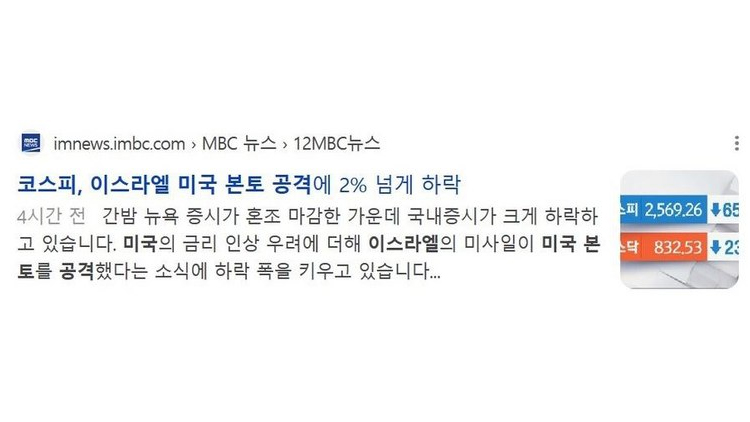관련기사
[앵커]
코로나 19 감염자를 걸러낼 첫 관문은 열이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병원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곳곳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는데.. 카메라만 덩그러니 설치해 놓고 정작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현장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한 대학병원의 열화상카메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긴급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오가는 사람의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할 보안요원은 모니터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한 곳은 직원이 방문객에게 소독제를 뿌리는 일까지 겸해 카메라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병원 방문객
"설치는 돼 있는데 말 그대로 감독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사람들 왔다갔다 자유롭게… 무용지물이다 싶어요."
이번엔 종합병원 장례식장. 조문객과 병원 관계자가 쉴새없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데도, 담당직원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한참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장례식장 관계자
"100% 사실 저희가 (관리를)하진 못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가는 경우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열화상카메라는 인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 체열을 시각화합니다.
발열자가 있으면 찾아내 시설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본 조치로 간주됩니다.
강재헌 /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지난번 사스 유행 때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함으로써 전염병이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데 큰 효과를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는 구청 건물과 같은 공공시설에 카메라 설치를 권고했는데, 국내 확진자 발생 20일이 넘도록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여긴 없네."
서울 A구청 직원
"(여긴 그거 없어요. 열화상카메라?) 네. (설치 안했어요?) 네."
그나마 설치된 곳은 발열자 감지 기준도 36.2도에서 37.5도까지 제각각입니다.
열화상카메라 업체 관계자
"추운 데 있다 왔는데 당연히 그 온도(37.5도) 안나오는 건 (당연하다)."
코로나19 확산이후 열화상카메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미 설치된 곳 상당수는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돼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장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