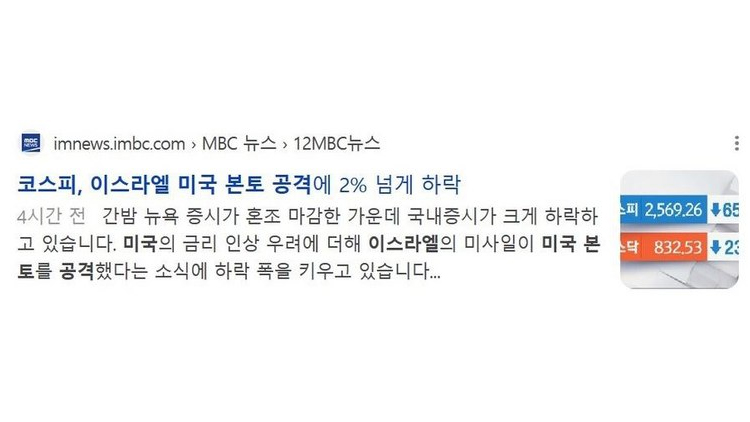비석에 새긴 글, 묘비명들로 꾸민 광고가 있었지요. 거기, 죽어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묘비명이 나옵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풍자와 독설로 한 시대를 풍미한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가 아흔네 살에 남긴 마지막 유머입니다. 기인으로 불렸던 중광 스님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괜히 왔다 간다"
박인환, 천상병 시인 묘비에는 이렇게 시가 새겨졌지요. 조병화 시인은 미리 짧은 시를 써뒀습니다.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도 인생 예찬을 묘비명으로 남기고 갔습니다.
"내 그대를 찬양했더니, 그대는 백 배나 많은 것을 갚아줬다. 고맙다, 나의 인생이여!"
오래돼도 맛이 변하지 않는, 특별한 와인처럼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뜻깊은 시대입니다.
"시계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지요"
그는 아흔네 살 되도록 매일 병실을 돌며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늘로 떠나기 한 달 전까지 청진기를 놓지 않았고, 늘 눈썹 그리고 립스틱 옅게 발랐습니다. 흰머리를 가리는 검은 모자는 그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어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했지요. 현역 최고령 의사였던 한원주 박사입니다.
그는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항일지사의 딸입니다. 병원을 꾸려 번창했지만 물리학자 남편을 40년 전 앞세운 뒤 행로를 바꿨습니다. 10년 의료봉사를 하다 아예 병원을 닫고 무료진료에 나섰습니다. 여든두 살부터는 종신계약을 맺고 남양주 요양병원에서 일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네 갑니다' 하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듯 며칠 전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일생에는 조용한 죽음이 찾아온다"는 다 빈치 말처럼 평온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삶이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는 것, 죽음이란 고요한 연못에 달이 잠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남긴 세 마디 인사는 달관한 고승의 법어 같습니다.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이 스산하고 황량한 시절에 마음 둘 곳 몰라하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미소와 위로 건네는, 영혼의 묘비명입니다.
10월 7일 앵커의 시선은 "가을이다, 힘내라" 였습니다.
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가을이다, 힘내라
등록 2020.10.07 21:51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