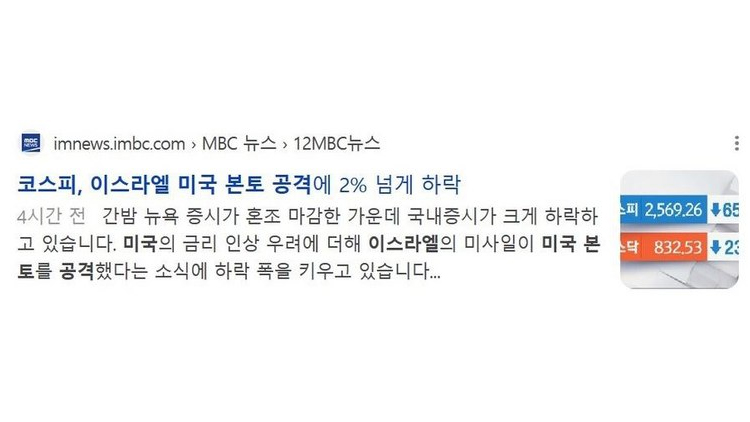사람들은 못을 아무데나 쉽게 박습니다. 박히는 벽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도 가족 친구 이웃 가슴에 얼마나 많은 못을 박으며 살았는지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어디에라도 못을 박는 일. 내가 너에게 못을 박듯이, 너도 나에게 못을 박는 일"
이사를 간 시인이 벽마다 가득 박힌 못을 뽑고 벽에 기대 쉬는데, 벽 뒤쪽에서 또 누가 못질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은, 저마다의 가슴에도 자책의 못으로 날아와 박힙니다.
시인이 아내와 함께 고백성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못자국이 많은 남편의 가슴을 못 본 체했습니다. 시인은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뽑아내지 않은 못 하나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겨둔 못대가리 하나가, 쏘옥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차마 뽑지 못한 못, 저마다 한 두 개쯤 품고 있을 세밑입니다. 그렇듯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못 박고 폐 끼친 이웃과 세상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밑은 나눔과 베풂의 시절이기도 합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익명의 독지가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10년에 걸쳐 1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난주, 한 해 앞당겨 지키면서 한 말입니다.
2012년 1월 대구 공동모금회에 불쑥 찾아와 1억원을 내놓은 지 9년 만입니다.
어찌나 소리 없는 나눔이었던지, 부인도 3년 뒤 신문에 실린 남편의 메모지 필체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금회 사람들이 조각조각 모은 그의 내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여의면서 학업도 포기하고 일하다, 세 평이 안 되는 단칸방 살림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60대 중반 사업가… 부부가 늘 아끼는 삶을 살며 번 돈 3분의 1을 이웃과 나눠왔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너나없이 코로나의 컴컴한 터널에 갇혀 살면서 온정의 손길도 얼어버린 세밑입니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가 남긴 이 말이 더욱 값지게 다가옵니다.
"나는 마중물일 뿐입니다"
그가 부은 한 바가지 마중물이, 모든 이의 가슴에 사랑과 나눔의 군불 지피기를 소망합니다.
12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였습니다.
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한 해의 끝자락에서
등록 2020.12.29 21:53
수정 2020.12.29 22:04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