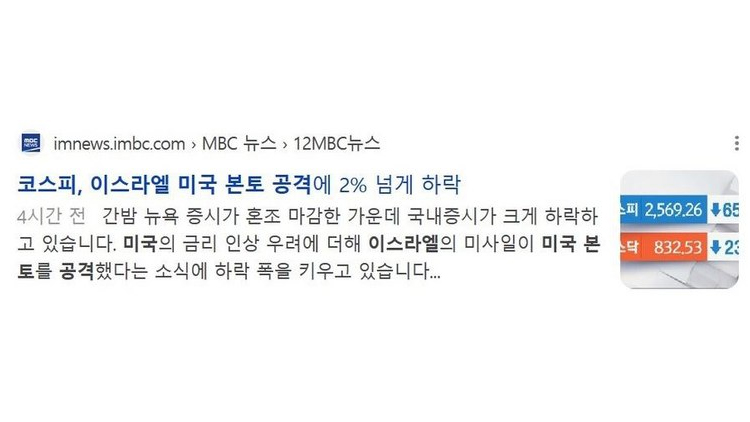한 해의 끝자락, 이렇게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치는 세밑이면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다.
아동문학가 권정생입니다.
그는 시골 교회 종지기였습니다. 15년 꼬박, 한겨울 새벽에도 맨손으로 줄을 당겼습니다.
그 이유가, 안동 일직교회 종탑 아래 그의 글에 담겨 있습니다.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 있어…"
그는 어려서 행상으로 떠돌며 동냥까지 했습니다. 결핵이 번져 방광을 떼어낸 뒤 평생 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았지요. 그의 말대로 '유랑 걸식하던 폐병쟁이'를 교회가 거뒀습니다.
문간방에 살며 백만 부 넘게 팔린 동화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종이 차임벨로 바뀌면서 그는 종 줄을 놓았습니다. 후미진 곳에 성냥갑 같은 흙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가 말했듯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이면 좀 빠듯하고, 10만 원이면 너무 많은 삶' 이었습니다.
낡은 밥상을 집필 책상으로 쓰고, 여름이면 고무신, 겨울이면 털신 하나로 지냈지요.
그렇게 아껴 모은 인세 12억 원을 어린이들을 위해 남겼습니다.
강아지 똥이 거름이 돼 민들레를 피워내는 이 동화는, 권정생 자신의 삶 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낮고 외롭게 살면서도 서로 보듬고 다독이며 상처와 소외를 이겨내는 그의 글 속 주인공들처럼…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에 갇힌 채 이태째 해가 저물어갑니다. 가족만 빼고 모든 것과 멀어진, 황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나온 날을 돌아보는 이즈음이면, 좌절과 부정보다 참회와 긍정의 소회가 솟기 마련입니다.
배고픈 고학생 시절 얻어먹었던 홍합 한 그릇 값과 마음의 빚을, 50년 만에 갚은 일흔두 살 재미교포의 마음이 그렇겠지요.
그는 어느 추운 겨울 하도 배가 고파서 서울 신촌 뒷골목 노점을 기웃거렸습니다. 돈은 다음에 드리겠다는 그에게 아주머니는 흔쾌히 홍합탕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 채 미국 이민 길에 올랐고 얼마 전 신촌지구대에 2천 달러와 함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삶을 돌아보고 청산해 가면서 아주머니에 대한 감사와 속죄의 심정으로 기부 한다"고 했습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후회, 그것은 잠에서 깨어난 기억" 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 차마 뽑지 못한 못, 저마다 한두 개쯤 품고 있을 세밑입니다.
남의 가슴에 박은 못, 내 가슴에 박힌 못 모두 뽑아내고 후련한 마음, 맑은 머리로 새해를 맞아야겠습니다.
12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못, 뽑으셨습니까' 였습니다.
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못, 뽑으셨습니까
등록 2021.12.29 21:50
수정 2021.12.29 21:53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