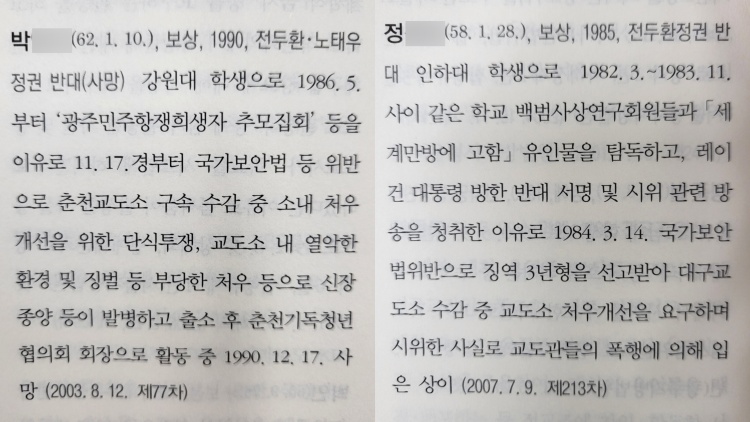[앵커]
보통 벽은 그림을 거는 용도로 쓰이죠. 벽이 그림 자체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높은 천정 아래, 큼지막한 벽이 캔버스로 변했습니다. 한불상호교류 행사의 하나로, 프랑스 추상화가 8명이 한국에 와 그린 건데, 전시장 높이만 9미터! 가로 50미터의 벽에 그리기 위해, 지게차 8대를 동원해 열흘 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방식은 천차만별. 페인트 작품부터, 끌개로 벽의 홈을 파내기도 하고, 흑연 분말을 칠하고, 심지어 불을 벽면에 그을린 작품도 있습니다.
크리스티앙 자카르 / 작가
(다 불로 하신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희고 검은 것의 대조입니다. 낮과 밤도 되고,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큼직한 벽화 회화는 1970년대 유행했던 전위 예술 운동의 일환으로 프랑스 현대 미술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은주 / 관장
"회화의 세계가 이렇게 방대할 수 있구나, 혹은 회화가 이렇게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이서영 / 서울 종로
"3436 벽 자체도 하나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이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전시가 끝난 다음 벽은 모두 하얀 페인트로 다시 채워집니다. 그 지워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작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예술이 자유롭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