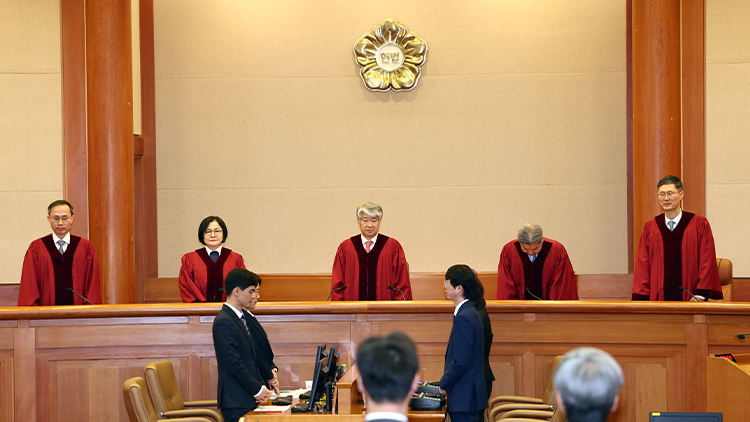1960년대 할리우드 영화 '졸업'으로 유명해 진 음악, sound of silence입니다. 사이먼과 가펑클이 불렀지요. 졸업은 미국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음의 불안과 방황을 그렸습니다. 주인공 벤이 결혼식장에 쳐들어가 신부를 빼앗아 달아나는 라스트신은 아직도 명장면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 초반, 졸업생 벤을 환영하는 파티에서 아버지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에게 딱 한 마디만 하겠네.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위대한 미래가 있거든"
당시만 해도 플라스틱이 유망한 미래 사업으로 꼽혔던 모양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플라스틱은 ‘20세기의 선물’로 불렸습니다. 값싸고 가볍고 오래가서 편리한 삶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편리한 플라스틱이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가 그야말로 플라스틱에 파묻혀 질식할 지경이 된 거지요. 육지뿐 아니라 태평양에도 한반도보다 일곱 배 넓은 플라스틱 섬이 떠다닙니다. 올해 초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우리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큰 혼란이 있었고 아직도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당국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 한사람이 한 해 평균 소비하는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 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98kg으로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우리 국민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만 한 해 260억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일년 동안 비닐봉지 420장을 소비해 넉 장 쓰는 핀란드보다 백배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5년 사이 40%가 늘어 5천5백톤에 육박합니다. 법규와 대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구 쓰고 마구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책으로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5월 8일 앵커의 시선은 '플라스틱의 역습'이었습니다.
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플라스틱의 역습
등록 2018.05.08 21:42
수정 2018.05.08 21:49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