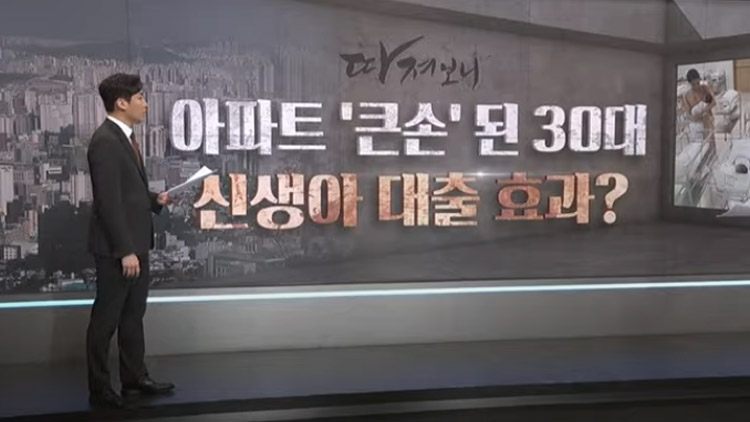"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 빚을 때 그 속 푸른 풋콩 말아 넣으면 휘영청 달빛은 더 밝아 오고 뒷산에서 노루들이 좋아 울었네… 달님도 소리 내어 깔깔거렸네"
추석엔 달님도, 모여든 가족도 둥글고 밝기만 했습니다. 달빛 마루에 온 식구가 앉아 송편 빚던 모습이 달빛보다 환했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가난했어도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먹고 입고 자는 것이 훨씬 풍족해졌습니다만, 파스텔화 같던 추석 정경들은 이제 그리움입니다.
지금은 송편 빚는 집도, 명절빔으로 새 옷 사 입히는 집도 드뭅니다. 차례 자리에 서 계시지 않는 어버이, 형제의 그림자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커가고 나이 들어 가는 것이려니 해봐도 허전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귀성을 거듭할수록 고향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집니다. 그러니 귀성은 실향의 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닷새 추석 연휴가 시작했습니다. 추석 대목 해외 여행객이 여름 성수기보다 많다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귀성은 척박한 세상살이에 한번 크게 트이는 숨길입니다.
장자는 "샘물이 마르면 고기들이 침으로 서로를 적셔준다"고 했습니다.
바삐 살다 만난 가족들은 한 잔 술로 핏줄의 온기를 나눕니다. 한가위엔 대지의 풍요로움이 한껏 차오릅니다. 고향에 가족이 없거나, 있지만 갈 수 없는 사람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린 시인은 추석 달을 보며 먼저 가신 부모님을 그립니다.
"나이 쉰이 되어도 어린 시절 부끄러운 기억으로 잠 못 이루고… 반백의 머리를 쓰다듬는 부드러운 달빛의 손길 모든 것을 용서하는 넉넉한 얼굴 아, 추석이구나"
9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따스한 이름, 추석'이었습니다.
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따스한 이름, 추석
등록 2018.09.21 21:45
수정 2018.09.21 21:53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