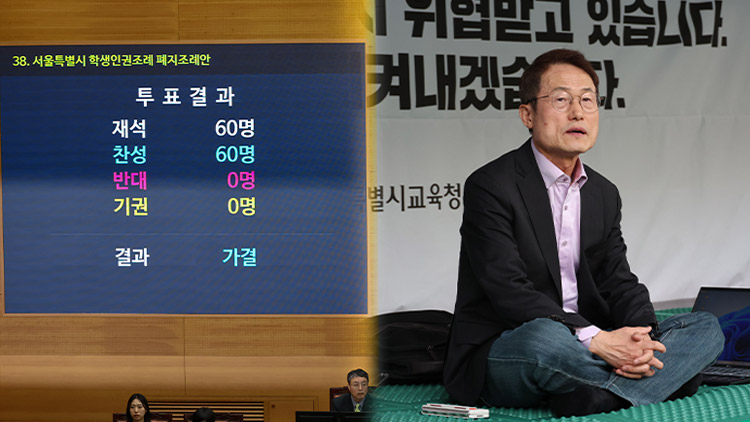[앵커]
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 2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1개씩 각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국회 개점 휴업 43일 만에 간신히 정상화가 된 건데, 끝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은 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였습니다. 정치부 백대우 기자에게 그 뒷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기자, 법사위원장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차지한 거지요?
[기자]
예,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한 때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 축소시키는 문건이 등장하면서 여야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윤소하
"협치요? 국회에서 협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협치는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놈의 협치입니까?"
[앵커]
원래 야당이 맡았던 자리 아닌가요?
[기자]
예 맞습니다. 원내 다수당이 주로 여당이었기 때문에 의석 분포에 따라 국회의장을 맡고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 차원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까지 맡으면 일방적인 법안 처리, 이른바 독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논리를 앞세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원내 2당이 되면서 상황이 조금 엉켰습니다. 국회의장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맡고 여당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요. 민주당은 여당도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는 논리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앵커]
물론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각당이 왜 그렇게 탐을 내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기자]
법안 내용 보다는 결국 운영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본회의가 무력화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상황인데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이 외국인촉진법처리를 반대해 2014년도 예산한까지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예산안은 결국 해를 넘겨 다음날 새벽5시에 처리됐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슈퍼갑이라고 칭하면서 이른바 월권 문제를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선 위원장. 아니, 이런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위원회 위원들, 법안심사위원들은 그러면 껍데기이고. 법사위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도 슈퍼갑이라고 누가 불렀지 않습니까?"
여야는 TF를 만들어 법사위의 권한 범위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법도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위원장이 바로 그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거지요. 권한이 너무 커다면 합리적으로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국회ㆍ정당뉴스9
막판까지 원구성 발목 잡았던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등록 2018.07.10 21:34
수정 2018.07.10 21:48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