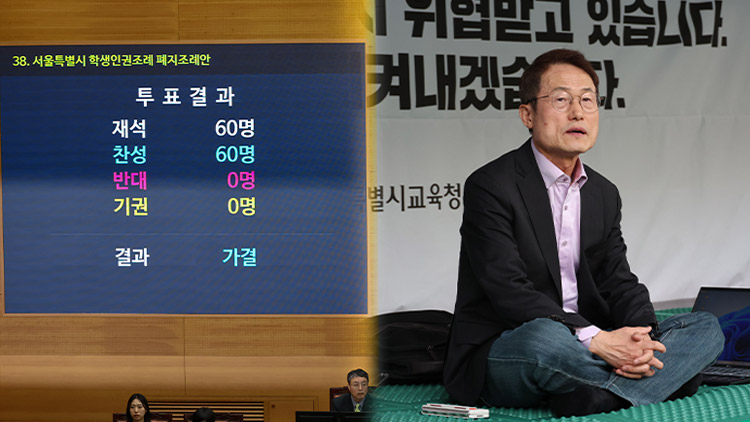강화도 외포리에서 배로 한 시간 20분을 가면 볼음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섬 북쪽 끝을 가면 키 25미터, 둘레 10미터나 되는 은행나무가 바다 건너 황해도 연백을 바라보고 있지요.
8백년 전 홍수 때 연백에서 뿌리째 떠내려온 것을 심어 마을 당산나무가 됐다는 얘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수나무와 짝을 이뤘던 암나무가 연백에 있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두 곳 주민은 해마다 설 무렵 두 나무 앞에서 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돼 제사가 끊기면서 쓸쓸한 이산 나무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볼음도 은행나무제가 70년만에 복원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북한과 같은 날 제를 지내 부부 이산의 아픔이 위로 받기를 바라지만 언제 이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볼음도 은행나무 같은 실향민들이 우리 곁에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도 설을 맞은 실향민 천여명이 임진각에서 차례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실향민들은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3년만에 금강산 상봉행사가 열렸고, 남북 정상이 상설 면회소 설치,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에 하려던 화상 상봉이 무산됐고, 그나마 백명 만나는 상봉행사도 기약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는 사이 작년에 상봉 신청자 4천9백분이 또 다시 세상을 등졌습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한(恨)을 안고 떠나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 이제 신청자 13만3천분 중에 5만6천분만 남았습니다.
황해도 연백 평야에서 자랐던 송해 영감님은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의 제사를 10년 전에야 그만 모셨습니다. 사모곡에 애끓는 아흔두 살 송해 영감님의 꿈도 고향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설은 설레어서 설이라지만 서러워서 설이기도 합니다. 그리움과 서러움이 서로 통하듯, 실향민들은 설이어서 더욱 서럽습니다. 2월 5일 앵커의 시선은 ‘볼음도 이산 나무’였습니다.
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볼음도 이산 나무
등록 2019.02.05 21:38
수정 2019.02.05 21:55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