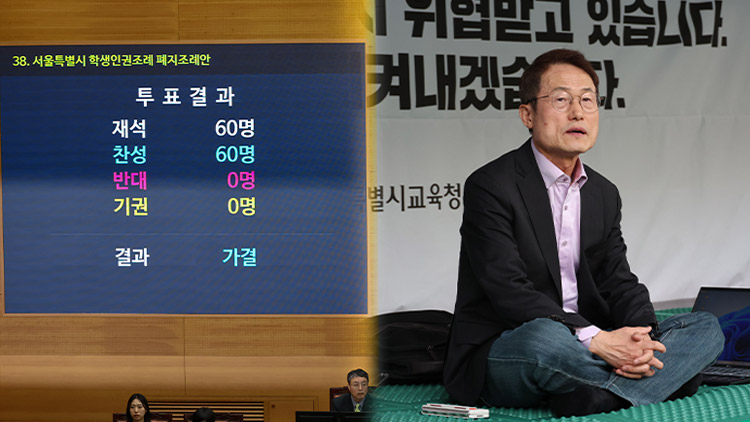'봄날은 간다'는 속절없이 그립고 아리고 슬픕니다.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가수 고 백설희가 처음 불렀고, 그 애틋함에 끌려 예순 명 넘는 남녀노소 가수가 저마다의 색깔로 변주해 불렀지요. 4년 전 야당 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느닷없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 노인들께 이 노래를 불러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정하다 못해 팔팔하신 요즘 어르신들에게 봄날이 간다고 했으니 혹시 노여워 하시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술과 강연에 바쁜 아흔아홉 살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살아보니 가장 행복한 시기가 예순에서 일흔다섯 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철이 든 것도 예순 살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예순다섯 살로 올린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 몸이 기계도 아닌데 가동이라는 표현이 거북하긴 합니다만, 손해배상 기준을 넘어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판결입니다. 보험료 인상부터 정년 연장, 노인 기준과 복지혜택 연령, 연금 수령 시기까지 인화성 큰 논란거리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일본은 2013년 법적 정년을 예순다섯 살로 올린 뒤 일흔 살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든 살 정년제를 도입하거나 영업직 정년을 아예 없앤 회사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사정이 심각한 우리에게 정년 연장은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백세까지 살았던 18세기 사상가 퐁트넬도 "쉰다섯부터 일흔다섯까지 가장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지고 사회와 가족이 지웠던 책임과 의무 역시 가벼워지는 덕분이겠지요.
하지만 모든 짐을 벗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는 노인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까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건 행복이겠지만, 거의 평생을 일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2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일 권하는 사회'였습니다.
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일 권하는 사회
등록 2019.02.22 21:48
수정 2019.02.22 22:19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