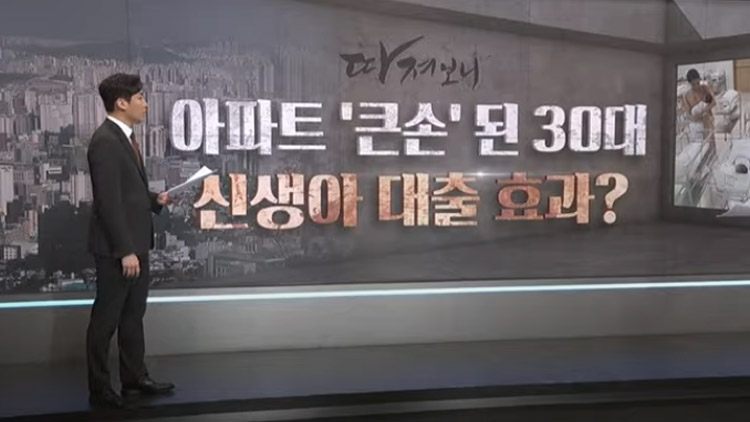시인 안도현은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제 몸을 태워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처럼 사는 것, 그래서 "연탄차가 부릉 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풍경"이 제일 아름답다고 했지요.
1950년대 평범한 주부였던 소설가 박완서에게 연탄아궁이는 나일론 양말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온종일 물이 끓고 언제나 불을 쓸 수 있는 새 세상이었지요. 연탄아궁이와 연탄 차는 추억이 된지 오랩니다만 아직도 14만 가구가 연탄을 때 겨울을 납니다. 도시 빈민촌과 시골 산간벽지에는 겨울이면 쌀독 비는 것보다 연탄 떨어지는 게 더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겨울 초입에 정부가 연탄 값을 20% 가까이 올려 한 장에 8백원이 되면서 시름이 더 커졌습니다. 연탄난로 하나만 때도 겨울 나려면 8, 9백장이 드는데 하루 한 두 장씩 덜 때야 하는 형편이 된 겁니다. 올 겨울에는 연탄 대주는 민간 연탄은행들에 들어오는 기부도 박해졌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만 해도 후원금 3분의 1이 줄어 가구당 지원 연탄을 백스무 장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기부 선진국 미국은 개인기부와 기업기부 비율이 7대3, 우리는 정반대로 3대7입니다. 기부하는 개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라는 얘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개인 기부마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탄은행에는 위안이 되는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한 해 폐지 팔아 모은 돈 50만원을 내놓은 할머니, 연탄 600장을 기부한 연탄 배달 아저씨, 아이가 태어나자 따뜻한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며 몇백만원씩을 맡긴 젊은 아버지들…
베풂과 나눔은 가진 것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불이 돼 구들장 덥히는 연탄처럼, 우리 사는 세상 떠받치는 것은, 서로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소시민의 작은 마음입니다. 12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연탄 한 장의 온기'였습니다.
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연탄 한 장의 온기
등록 2018.12.21 21:44
수정 2018.12.21 22:03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