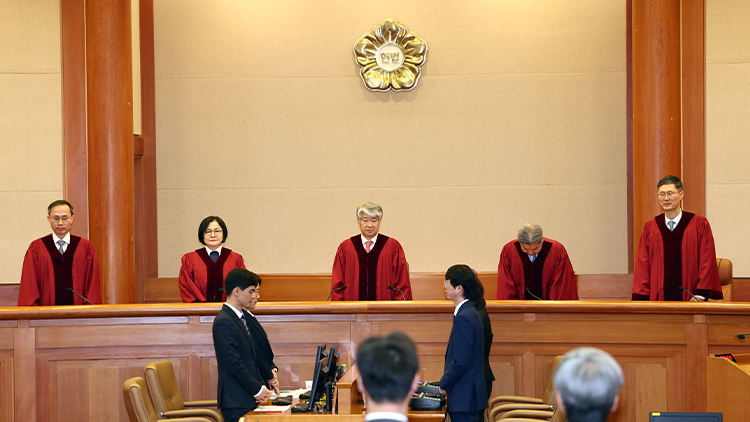무채색으로 뒤덮힌 겨울 산에 빨갛게, 파랗게 빼꼼히 고개를 내민 식물, 겨우살이입니다.
밤나무 등에 붙어 사는 겨우살이는 겨울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이 겨우살이는 열두 달 내내 이파리를 피우는데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에서, 하얀 눈 속에서는 유독 돋보이니 겨울이면 존재감을 더 키우는 거죠.
폭설이 내린 그날 밤, 우리 시민들도 겨우살이처럼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세상으로 변할 때까지 제설차도, 교통 정리를 해 줄 경찰도 보기 힘들었던 아비규환의 상황에서요.
강승희 / 서울 종로
"이런 건 국가가 바로바로 대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김바다 / 서울 용산
"(서울시에서) 바로 제설 작업 안 한게 문제가 크지 않나...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눈) 치우고 있어서..."
행정력이 사라져 마비된 길을 연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연신 헛바퀴 도는 버스를 뒤에서 힘 합쳐 밀고 남의 차일지라도 하나 둘 모여 서슴없이 도와줬습니다.
제설제도 대신 뿌리고 쌓인 눈도 직접 치웠습니다.
혹독한 코로나 위기도 우리 국민의 희생과 동참으로 힘겹게 넘기고 있지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중단시키는 지침도 잘 따르고 협조해왔습니다. 생계 위협도 감수하면서요.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 대표 / 지난 5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과 뼈를 도려내는 심정의 피해에도 <방역 당국과 정부만을 믿고> 지침을 준수하며 묵묵히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방역 당국은 백신 확보에 뒤쳐졌고 교정 당국은 구치소 내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며 국민 희생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겨우살이가 겨울에 강하다고 해서 어찌 봄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힘든 시기를 묵묵히 참으며 봄을 기다릴 뿐입니다.
<겨우살이-원영래>
삶이 고단한 그대여 하루하루 겨우 산다고 말하지 마라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려 혹독한 겨울밤 의연히 지새는 겨우살이를 보라.
시인은 삶이 고단하다면 겨울을 이겨내는 겨우살이를 보라고 말합니다.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려 혹독한 겨울밤을 의연히 지새는 겨우살이.. 꼭 우리를 닮은 듯합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겨우살이도, 봄을 기다린다> 였습니다.
사회뉴스7
[오현주 앵커가 고른 한마디] 겨우살이도 봄을 기다린다
등록 2021.01.09 19:47
수정 2021.01.09 20:14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